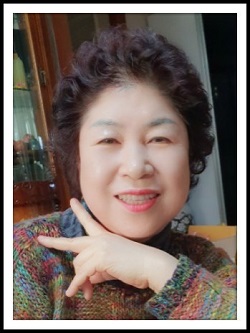
허름한 골목 어귀 후미진 곳에 오렌지색 비닐 덮개를 씌운 붕어빵 장수의 손수레가 새로 생겼다. 그 옆에는 도시의 온갖 소리를 먹고도 소리를 비울 줄 아는 나무 한그루가 성글게 매달린 나뭇가지를 하늘로 뻗고 있었다. 저 나무처럼 삶도 아픔 젖어드는 시간을 털어내고 비울 수 있어야 한다. 예기치 못한 외로움에 빠져들지라도 어느 한 시절에 피워 올렸던 향기와 열매로 생의 맥박을 다시 뛰게 해야 한다.
꽃 진 자리의 갈색 열매는 덜 여문 탓인지 힘겹게 바람을 견디고 있었다. 해거름인지 노을도 희끄무레하다. 서쪽 하늘은 어둠을 맞을 채비에 바쁘다. 드르륵, 비닐 덮개 자크를 여는 소리가 났다. 가던 길을 멈추고 깜짝 놀라 쳐다봤다. 머리가 희끗한 노인이 주인인가 보다. 얼핏 보기에 그동안 곱게 사신 분 같았다. 동네 한 바퀴를 돌고 다시 그곳으로 가보았다. 혼자 우두커니 앉아 낡은 신문을 뒤적거리고 있었다. 거센 물살 이는 세상사를 두 손으로 살살 다독거리듯 신문을 넘기고 있었다.
그 후 몇 날이 흘렀다. 출출하던 차에 붕어빵 냄새가 코를 자극했다. 눈물 많은 계절을 가장 많이 앓은 냄새를 품고 붕어빵은 익어갔다. 문득 그 노인의 삶이 궁금해졌다. 멀리는 못 가고 동네를 몇 바퀴 도는 것으로 운동을 대신하던 어느 날이었다. 첫 마수를 핑계 삼아 노인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생겼다. 그의 지난한 삶을 듣고 짠한 마음이 들어 오랫동안 기억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오렌지색 지붕이 참 예쁘네요.”
오렌지색은 추위를 떠먹고 사는 겨울을 따뜻하게 해주는 마력이 있다. 그 마력 때문인지 붕어빵을 자주 사먹으러 왔다.
“내 나이를 오렌지색에 비유해도 될까 모르겠구만. 여기가 해거름 노을이 가장 예쁜 곳이라서.”
한참 시간이 흘러 서로가 임의로워졌다. 쓸쓸하게 때로는 허허 웃으며 노인은 살아온 내력을 이야기해 줬다. 그는 과거에 교장 선생님이었다. 노인의 삶은 정말 사진처럼 또렷하고 반듯했다. 바람과 햇살을 내려 두루두루 살피는 봄처럼 선생님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했다.
이른 나이에 결혼을 했지만 뒤늦게야 아들 하나를 낳았다. 그 뒤론 아이가 없어 부부는 애지중지 아들을 키웠다. 열 아들 부럽지 않게 키운 아들이 대학을 나와 공무원 되기를 원했지만 한사코 사업을 고집했다. 처음엔 잘되는 것 같아 퇴직금 전액을 사업 자금에 보태 쓰라고 대줬다. 세상으로 뻗어나가는 자식의 푸른 힘을 키워주고 싶었던 것이다. 오롯히 아들만 바라보던 부부는 세상 물정도 잘 몰랐다. 직업이라고는 평생 아이들 가르치고 꽃 가꾸는 일이 전부라고 했다.
“이렇게 학교 앞 골목에서 붕어빵이라도 팔면서 아이들 소리라도 듣고 싶어서...”
갑자기 가슴이 미어질 것처럼 아팠다. 재잘거리는 아이들의 소리로 노인은 눈을 뜨고 귀를 씻고 아픔을 삭이고 있었다. 가슴을 짓누르는 삶의 무게를 조금씩 덜어내고 있었다.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팥 알갱이가 입속에서 맴돌았다.
“미안해요. 좋은 소리만 해야 되는데.”
겨울로 접어든 저녁은 삼킬 수도 뱉을 수도 없는 상처들로 몹시 추웠다. 아니라고 웃으며 나는 도리질을 쳤지만 안 듣느니만 못해 쓸데없는 호기심을 나무랬다.
"그래도 세상은 참 아름다워요."
나는 위로 아닌 위로의 말을 건넸다. 무릎을 웅크린 어둠을 밀어내며 가로등은 하나둘씩 켜지기 시작했다. 우리는 스스럼없이 안부를 물었고, 먹고 싶지 않아도 어스름이 지면 저녁노을을 버무린 붕어빵을 곧잘 사먹었다.
어느 해 가을, 잎이 다 떨어진 맨사댕이 은행나무를 보러 그 골목을 찾아갔다. 몇 개 남아 가을을 지탱하던 열매도 메말라, 달롱거리는 풍경이 그 노인처럼 애닮았다. 지금은 어디에 계시는지, 마른 잎처럼 순백의 마음으로 동화 한 줄 읖조리던 그분의 마음 색깔처럼 저녁노을만 곱다. 오렌지색 노을 지붕을 인 은행나무가 붕어빵을 굽고 있는지 바람 불길이 타올랐다.
